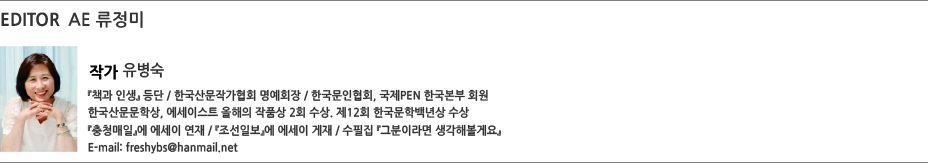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선물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선물
'글. 유병숙'
조각보를 햇빛 바른 곳에 넌다. 이는 시어머니 생전에 손수 만드신 것이다. 딸애가 아기 때 입었던 색깔 고운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곱게 이었다. 지금도 아이는 머리맡에 두었다가 껴안고 잠을 청하곤 한다.
함께 빤 얇은 이불도 털어서 넌다. 이건 아이들 몫으로 만들어주신 여름 이불이다. 앞은 꽃분홍색 면으로, 뒤판엔 파랑색 동그란 무늬가 있는 지지미 천을 대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살짝 덮곤 했는데, 새 이불에 밀려 뒷방 신세가 되었었다. 이불을 널다 보니 새삼 그 시절의 어머니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남달랐다. 웬만한 소품은 물론, 옷도 척척 만들어 입곤 하셨다. 눈썰미로만 만든 옷인데도 몸에 척 들어맞는 것이 늘 신기했다.
여름엔 식구대로 모시 적삼을 해 입히셨다. 시아버님이 하얀 모시 적삼을 입고 긴 흰머리를 바람에 날리면, 할아버지 동화책에 나오는 신선 같다며 손주들이 손뼉을 쳤다. 어머니는 살짝 훔쳐보시곤 미소를 지으셨다. 사위들이며 아들들도 삼베로 바지를 해 주셔서 여름엔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아이들의 여름철 놀이복은 주로 지지미 천으로 만드셨다. 다소 촌스러워 보였지만 시원하고 활동하기 편해 다투어 입곤 했다. 사촌들끼리 내려 입는 옷이 되었다가 이제는 증손자 차지가 되었다.

하루는 아이들의 키에 꼭 맞는 이불을 마름질하셨다. 덮기도 전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체구가 왜소해서인지 큰 이불을 불편해 하셨다. 몸에 딱 맞는 작은 이불을 만들어 주곤 하셨는데 비로소 아이들 순서가 되었다. 가벼운 것이 여름이불로는 제격이었다. 할머니의 선물을 아이들도 좋아라 하며 온종일 놀이 삼아 들고 다니곤 했다.
치매 초기만 해도 어머니의 바느질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넓은 무명천을 사다 드리면 조각조각 마름질해서 집집이 행주를 만들어 나누어 주곤 하셨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셨다. 우리 부부는 환자용 침대를 마련해 뉘어 드렸다. “집에 오니 참 편하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셨다. 다른 건 다 잊으신 분인데 집으로 돌아온 건 어찌 아시는 걸까?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푹푹 찌는 여름 한복판이었다. 어머니는 용케도 기운을 회복하셨다. 간병하는 나는 더워 쩔쩔맸지만, 환자에게 안 좋을까 봐 선풍기도 틀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꾸만 춥다 하셨다. 문득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불이 생각났다. 장롱 깊이 넣어 두었던 그 시절 이불을 펼치니 고운 빛깔이 되살아났다.
“아이구 좋구나. 참 가볍고 예쁘고. 언니 고마워요.” 연신 손으로 이불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누가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네.” 당신이 손수 만든 이불을 당신이 덮으셨다. 이보다 마음에 드는 이불이, 이보다 잘 맞는 맞춤 이불이 따로 있을까. “어머니,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이불이에요. 생각나시지요?” 그러자 또 멀뚱해지는 어머니였다. 기억 못 하는 걸 눈치채면 또 서러워하실까 싶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아이의 이불을 번갈아 덮으셨다. 새로 덮으실 때마다 무에 그리 맘에 드는지 연신 쓰다듬곤 하셨다. 기억은 안 나지만 손맛은 남았나 보다.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곤 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보름 동안 그 이불을 덮고 주무시듯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소임을 끝낸 이불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친구들은 망자가 덮었던 이불이니 어서 태워버리든지 버리라고 성화를 해댔다. 요즘은 태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물론 우리 집 마당에서 태워도 그만이긴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키지 않았다. 이불 수거통 앞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다. 몇 번의 이사 때에도 간직한 이불이었다.
이것은 망자의 이불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이 비로소 은혜를 갚았다. 나는 이불을 햇빛에 널며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함께 빤 얇은 이불도 털어서 넌다. 이건 아이들 몫으로 만들어주신 여름 이불이다. 앞은 꽃분홍색 면으로, 뒤판엔 파랑색 동그란 무늬가 있는 지지미 천을 대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살짝 덮곤 했는데, 새 이불에 밀려 뒷방 신세가 되었었다. 이불을 널다 보니 새삼 그 시절의 어머니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남달랐다. 웬만한 소품은 물론, 옷도 척척 만들어 입곤 하셨다. 눈썰미로만 만든 옷인데도 몸에 척 들어맞는 것이 늘 신기했다.
여름엔 식구대로 모시 적삼을 해 입히셨다. 시아버님이 하얀 모시 적삼을 입고 긴 흰머리를 바람에 날리면, 할아버지 동화책에 나오는 신선 같다며 손주들이 손뼉을 쳤다. 어머니는 살짝 훔쳐보시곤 미소를 지으셨다. 사위들이며 아들들도 삼베로 바지를 해 주셔서 여름엔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아이들의 여름철 놀이복은 주로 지지미 천으로 만드셨다. 다소 촌스러워 보였지만 시원하고 활동하기 편해 다투어 입곤 했다. 사촌들끼리 내려 입는 옷이 되었다가 이제는 증손자 차지가 되었다.

하루는 아이들의 키에 꼭 맞는 이불을 마름질하셨다. 덮기도 전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체구가 왜소해서인지 큰 이불을 불편해 하셨다. 몸에 딱 맞는 작은 이불을 만들어 주곤 하셨는데 비로소 아이들 순서가 되었다. 가벼운 것이 여름이불로는 제격이었다. 할머니의 선물을 아이들도 좋아라 하며 온종일 놀이 삼아 들고 다니곤 했다.
치매 초기만 해도 어머니의 바느질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넓은 무명천을 사다 드리면 조각조각 마름질해서 집집이 행주를 만들어 나누어 주곤 하셨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셨다. 우리 부부는 환자용 침대를 마련해 뉘어 드렸다. “집에 오니 참 편하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셨다. 다른 건 다 잊으신 분인데 집으로 돌아온 건 어찌 아시는 걸까?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푹푹 찌는 여름 한복판이었다. 어머니는 용케도 기운을 회복하셨다. 간병하는 나는 더워 쩔쩔맸지만, 환자에게 안 좋을까 봐 선풍기도 틀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꾸만 춥다 하셨다. 문득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불이 생각났다. 장롱 깊이 넣어 두었던 그 시절 이불을 펼치니 고운 빛깔이 되살아났다.
“아이구 좋구나. 참 가볍고 예쁘고. 언니 고마워요.” 연신 손으로 이불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누가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네.” 당신이 손수 만든 이불을 당신이 덮으셨다. 이보다 마음에 드는 이불이, 이보다 잘 맞는 맞춤 이불이 따로 있을까. “어머니,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이불이에요. 생각나시지요?” 그러자 또 멀뚱해지는 어머니였다. 기억 못 하는 걸 눈치채면 또 서러워하실까 싶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아이의 이불을 번갈아 덮으셨다. 새로 덮으실 때마다 무에 그리 맘에 드는지 연신 쓰다듬곤 하셨다. 기억은 안 나지만 손맛은 남았나 보다.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곤 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보름 동안 그 이불을 덮고 주무시듯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소임을 끝낸 이불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친구들은 망자가 덮었던 이불이니 어서 태워버리든지 버리라고 성화를 해댔다. 요즘은 태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물론 우리 집 마당에서 태워도 그만이긴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키지 않았다. 이불 수거통 앞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다. 몇 번의 이사 때에도 간직한 이불이었다.
이것은 망자의 이불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이 비로소 은혜를 갚았다. 나는 이불을 햇빛에 널며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