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정연 작가
manjuyeon1@hanmail.net
2023-07-19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열무김치
'글. 이정연'
잘 익은 열무김치를 앞에 두고도 얼른 수저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콩밭 고랑에 열무를 심었습니다. 이리저리 흩뿌려서 아무렇게나 돋아난 열무나 얼갈이배추는 연하게 잘 자랍니다. 열무는 시골 농가의 여름 한때 없어서는 안 될 남새이기도 했지만 추수하기 전 농가의 푼돈 마련에 더없이 요긴한 작물이었습니다.
시골 장날을 하루 앞둔 여름 저녁 우리는 열무 뽑기에 동원되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내일 십 리를 걸어 학교에 가야 한다고 봐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온 식구가 콩밭 고랑에 엎드려 열무를 뽑습니다. 열무나 얼갈이배추는 금방 시들어 버려서 해가 뉘엿한 시간에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밤새 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튿날 장에 내다 팔 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요. 뽑은 열무는 남폿불을 켠 마당에 둘러앉아 다듬고 단으로 묶습니다. 곧 냇가로 가져가 뿌리를 씻어 가지런히 세우고 물에 적신 무명보자기를 덮어둡니다.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않은 어머니는 첫 새벽에 보리밥을 한 솥 지어 놓고 열무를 무명보자기에 싸서 무겁도록 이고 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집 어머니들이 함께 새벽을 밟고 시장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 날이 희붐한 시간 쯤 시장 언저리에 도착하고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 대구에서 온 장사꾼들 눈에 잘 띄고 한 번에 다 넘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장에 가시고 저는 기대에 부풉니다. 겉장에다 줄을 치고 쓰고 있던 산수 공책은 사오시겠다고 일찌감치 약속해 두었고, 잘 팔리면 먹고 나면 입천장이 다 헤지는 왕사탕이라도 하나 사 오실지 모르니까요. 다른 날보다 학교서 일찍 돌아와 소 꼴도 한 삼태기 해놓고 얌전하게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긴 여름 해가 산마루에 걸려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애가 마른 저는 동네 아이들 집으로 달려가 네 어머니는 오셨느냐고 물어봅니다. 다행히 그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열무김치에 만 보리밥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도 여전히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어둠은 깊어지고 능선이 사라져버린 산에서는 삐삐 호랑지빠귀가 울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어 언니와 저는 어머니 마중을 가기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개가 짖는 마을을 벗어나고 큰 소나무가 있는 길모퉁이를 지나고 가재가 나오는 옹달샘을 지나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마을 어른 어느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니와 저는 똑같이 우울해졌습니다. 잘 팔리면 그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가 안 오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짐작은 하면서도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주위는 완전히 깜깜해지고 어둠 속에 길만 보얗게 펼쳐졌습니다. 명암도 높낮이도 구분이 안 되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저를 언니는 몇 번이고 일으켰습니다. 산에서 들리는 바스락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서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갔는지 주위는 곧 잠잠해졌지만 잡은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미끈거렸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장에 가신 분들이 한데 모여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당연히 함께 오시겠지 했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아 가보기로 했습니다.
걱정하는 어른들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이제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일 킬로쯤을 더 걸었을까요. 외딴집 희미한 불빛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에 이고 가셨던 보퉁이를 그대로 이고 오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체신이 온통 보퉁이에 파묻혀 보퉁이만 걸어오시는 같았습니다.
푹 꺾어진 허리를 하고 간신히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뭐 하러 이 밤길 오느냐고 도리어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가져가신 것보다 더 많아 보이는 열무 몇 단은 제가 들고 언니는 어머니와 보퉁이를 나누어서 이고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오늘 시장에는 온통 열무밖에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밥도 거르고 삼십 리를 걸어 도착한 장터, 행여나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이 열무의 주인일까 쳐다보았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열무김치 보시기를 내동댕이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많은 사람이 식탁 위, 한 보시기의 열무김치를 위해 씨 뿌리고 김을 매고 다듬고 씻어 정수리가 아프도록 이고 온 땀의 의미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불같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안 팔리면 근처 식당에라도 거저 주고 요기나 하고 오지 미련하게 그걸 그냥 이고 오신다고요. 어머니는 종일 머리에 수건 하나를 쓰고 시장에 앉아, 땡볕에 김매던 땀방울의 가치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것인가 오기도 나셨을 겁니다. 늦은 밤 부뚜막에 앉아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말아 무심히 입으로 가져가시는 어머니의 대접 속에는 밥알은 몇 개 없고 온통 열무뿐이었습니다. 원망스럽던 아버지의 그 역정조차 이젠 당신 자신을 향했던 것이었음을 아는 지금 여전히 열무김치 앞에서 서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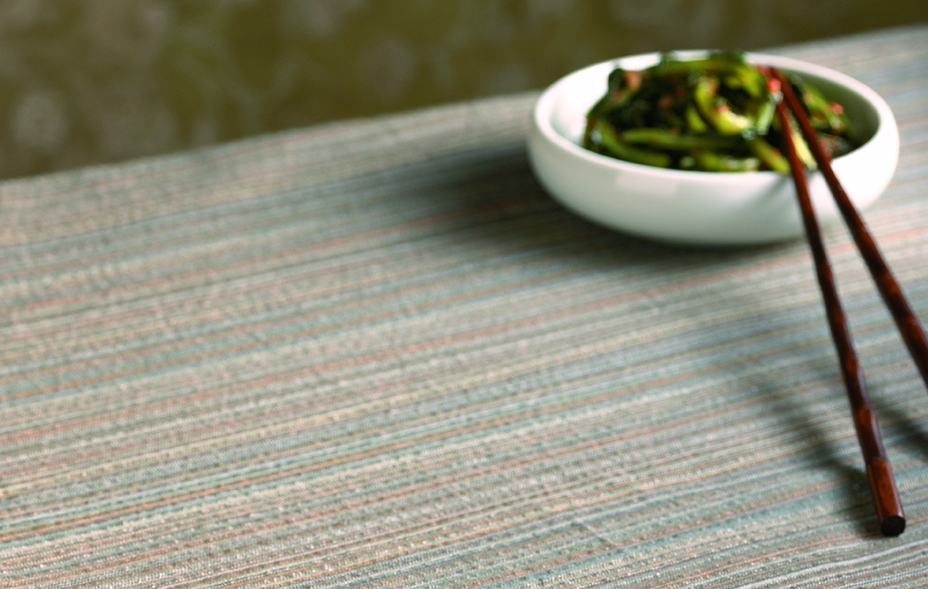
제 마음의 화랑에는 처연하게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어린 소녀와 까만 머루 같은 눈을 깜빡이며 애써 울음을 참는 조금 더 큰 소녀, 그리고 그 소녀들만큼 작은 흰 무명적삼의 여인이 길에 앉아 시든 열무를 서로 나누고 있는 풍경입니다.
소녀는 열무 팔러 가셨던 그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림을 꺼내 봅니다. 그림은 어느새 콩밭으로 변하고 콩 포기 틈새에서도 잘 자라던 푸른 생명의 기운 열무처럼 다시 힘이 솟고 씩씩해지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배짱이 더욱 두둑해지는 것입니다.
생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소녀 곁에서 가난은 이제 저만치 물러나 있지만, 열무김치는 가슴 깊이 남아 어려울 때마다 힘을 줍니다. 간이 배고 양념이 들어가고 숙성이 되어야 비로소 맛이 드는 열무김치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애정으로 한 데 버무려져야 가정도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어머니의 고달픈 산골 시집살이도 그날 열무를 나누어서이고 오던 어린 딸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더러는 위로도 해봅니다.
EDITOR 편집팀
시골 장날을 하루 앞둔 여름 저녁 우리는 열무 뽑기에 동원되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내일 십 리를 걸어 학교에 가야 한다고 봐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온 식구가 콩밭 고랑에 엎드려 열무를 뽑습니다. 열무나 얼갈이배추는 금방 시들어 버려서 해가 뉘엿한 시간에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밤새 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튿날 장에 내다 팔 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요. 뽑은 열무는 남폿불을 켠 마당에 둘러앉아 다듬고 단으로 묶습니다. 곧 냇가로 가져가 뿌리를 씻어 가지런히 세우고 물에 적신 무명보자기를 덮어둡니다.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않은 어머니는 첫 새벽에 보리밥을 한 솥 지어 놓고 열무를 무명보자기에 싸서 무겁도록 이고 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집 어머니들이 함께 새벽을 밟고 시장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 날이 희붐한 시간 쯤 시장 언저리에 도착하고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 대구에서 온 장사꾼들 눈에 잘 띄고 한 번에 다 넘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장에 가시고 저는 기대에 부풉니다. 겉장에다 줄을 치고 쓰고 있던 산수 공책은 사오시겠다고 일찌감치 약속해 두었고, 잘 팔리면 먹고 나면 입천장이 다 헤지는 왕사탕이라도 하나 사 오실지 모르니까요. 다른 날보다 학교서 일찍 돌아와 소 꼴도 한 삼태기 해놓고 얌전하게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긴 여름 해가 산마루에 걸려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애가 마른 저는 동네 아이들 집으로 달려가 네 어머니는 오셨느냐고 물어봅니다. 다행히 그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열무김치에 만 보리밥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도 여전히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어둠은 깊어지고 능선이 사라져버린 산에서는 삐삐 호랑지빠귀가 울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어 언니와 저는 어머니 마중을 가기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개가 짖는 마을을 벗어나고 큰 소나무가 있는 길모퉁이를 지나고 가재가 나오는 옹달샘을 지나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마을 어른 어느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니와 저는 똑같이 우울해졌습니다. 잘 팔리면 그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가 안 오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짐작은 하면서도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주위는 완전히 깜깜해지고 어둠 속에 길만 보얗게 펼쳐졌습니다. 명암도 높낮이도 구분이 안 되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저를 언니는 몇 번이고 일으켰습니다. 산에서 들리는 바스락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서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갔는지 주위는 곧 잠잠해졌지만 잡은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미끈거렸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장에 가신 분들이 한데 모여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당연히 함께 오시겠지 했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아 가보기로 했습니다.
걱정하는 어른들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이제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일 킬로쯤을 더 걸었을까요. 외딴집 희미한 불빛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에 이고 가셨던 보퉁이를 그대로 이고 오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체신이 온통 보퉁이에 파묻혀 보퉁이만 걸어오시는 같았습니다.
푹 꺾어진 허리를 하고 간신히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뭐 하러 이 밤길 오느냐고 도리어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가져가신 것보다 더 많아 보이는 열무 몇 단은 제가 들고 언니는 어머니와 보퉁이를 나누어서 이고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오늘 시장에는 온통 열무밖에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밥도 거르고 삼십 리를 걸어 도착한 장터, 행여나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이 열무의 주인일까 쳐다보았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열무김치 보시기를 내동댕이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많은 사람이 식탁 위, 한 보시기의 열무김치를 위해 씨 뿌리고 김을 매고 다듬고 씻어 정수리가 아프도록 이고 온 땀의 의미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불같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안 팔리면 근처 식당에라도 거저 주고 요기나 하고 오지 미련하게 그걸 그냥 이고 오신다고요. 어머니는 종일 머리에 수건 하나를 쓰고 시장에 앉아, 땡볕에 김매던 땀방울의 가치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것인가 오기도 나셨을 겁니다. 늦은 밤 부뚜막에 앉아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말아 무심히 입으로 가져가시는 어머니의 대접 속에는 밥알은 몇 개 없고 온통 열무뿐이었습니다. 원망스럽던 아버지의 그 역정조차 이젠 당신 자신을 향했던 것이었음을 아는 지금 여전히 열무김치 앞에서 서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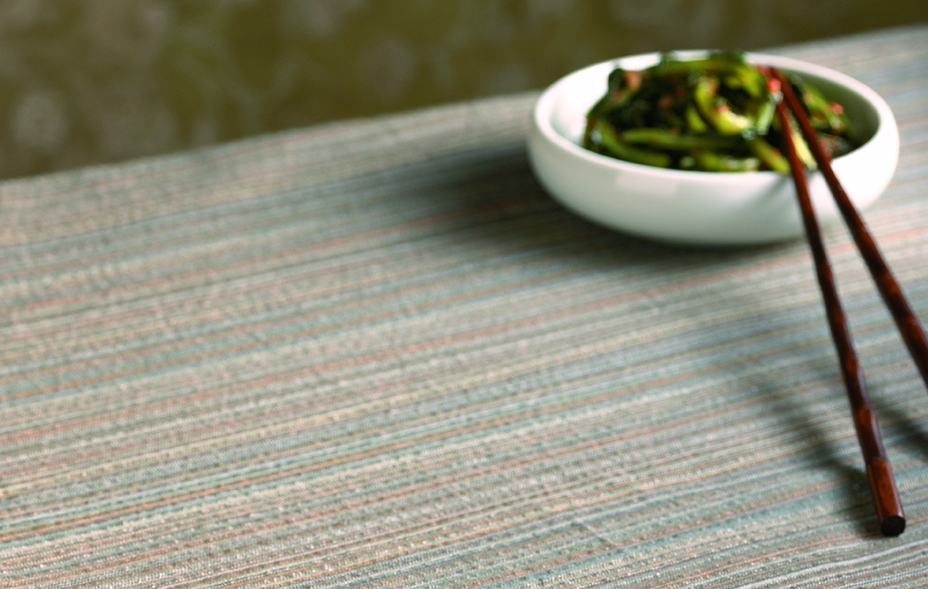
제 마음의 화랑에는 처연하게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어린 소녀와 까만 머루 같은 눈을 깜빡이며 애써 울음을 참는 조금 더 큰 소녀, 그리고 그 소녀들만큼 작은 흰 무명적삼의 여인이 길에 앉아 시든 열무를 서로 나누고 있는 풍경입니다.
소녀는 열무 팔러 가셨던 그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림을 꺼내 봅니다. 그림은 어느새 콩밭으로 변하고 콩 포기 틈새에서도 잘 자라던 푸른 생명의 기운 열무처럼 다시 힘이 솟고 씩씩해지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배짱이 더욱 두둑해지는 것입니다.
생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소녀 곁에서 가난은 이제 저만치 물러나 있지만, 열무김치는 가슴 깊이 남아 어려울 때마다 힘을 줍니다. 간이 배고 양념이 들어가고 숙성이 되어야 비로소 맛이 드는 열무김치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애정으로 한 데 버무려져야 가정도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어머니의 고달픈 산골 시집살이도 그날 열무를 나누어서이고 오던 어린 딸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더러는 위로도 해봅니다.

EDITOR 편집팀

이정연 작가
이메일 : manjuyeon1@hanmail.net
2003년 4월 수필문학 등단.
2004년 중부매일신문 세정유감코너 짧은 수필 집필 (1월-4월까지)
2004년 여름호 수필 ‘망월사에서’ 에세이문학 등단
2004년 영남수필 회원 –2019년
2006년~2008년 에세이문학 올해의 수필 20선 추천
에세이문학 수필과 비평 에세이21 수필사랑 대구문협지 다수 기고
2011년 - 현재 대구 달서구 현대힐공인중개사 소장
2004년 중부매일신문 세정유감코너 짧은 수필 집필 (1월-4월까지)
2004년 여름호 수필 ‘망월사에서’ 에세이문학 등단
2004년 영남수필 회원 –2019년
2006년~2008년 에세이문학 올해의 수필 20선 추천
에세이문학 수필과 비평 에세이21 수필사랑 대구문협지 다수 기고
2011년 - 현재 대구 달서구 현대힐공인중개사 소장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11-20 08:56:58

-
2024-10-16 08:52:07

-
2024-08-28 08:53:01

-
2024-07-24 08:48:47

-
2024-06-19 08:39:16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05-22 09:41:11

-
2025-05-22 09:22:49

-
2025-05-21 10:01:06

-
2025-05-15 09:56:54

-
2025-05-15 09: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