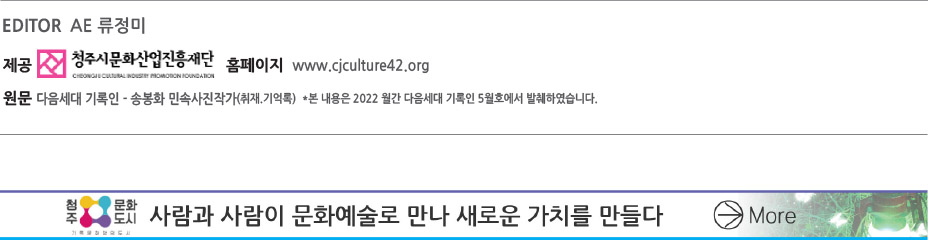커뮤니티

민속사진가 ‘송봉화’
2023-03-16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다음 세대 기록인
민속사진가 ‘송봉화’
'기록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음세대를 위한 기록은 차근차근 쌓일 거예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속사진작가 송봉화입니다.
사진작가라는 명칭 앞에 ‘민속’이 수식으로 붙었습니다.
독자들이 쉽게 ‘민속’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에는 ‘민속학과’라는 전공이 있는데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 학교에 전공학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안동대 민속학과 정도가 남아있어요. 또한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학예사로 일하고 있고요. 예부터 내려오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통과의례, 세시풍속, 생산, 민간신앙,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민속’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죠.

사진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버님께서 사진을 하셨으니 어릴 적부터 그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사진 찍어주느라 바빴었죠. 그걸로 용돈을 쓰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후에도 사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누구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생계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식장을 운영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평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전국을 다닐 수 있었죠. 제가 타던 차가 코란도였는데 작업하면서 두 대나 박살을 냈어요. 그만큼 전국 많은 곳을 누비고 다닌 거죠.
전국 안 가보신 곳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많이 바뀌고 변화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변하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고민을 해보니 가장 고유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장례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 앞에 ‘상(喪)’자를 붙여서 ‘상장례(喪葬禮)’라고 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예(禮)를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그들의 근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례를 봐야 해요. 사람이 살면서 겪는 통과의례를 보면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백일부터 시작해 돌, 성혼식, 회갑 등으로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의례가 바로 장례죠. 그 원초적인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민족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민속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귀중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선생님의 활동들이 지자체나 국가의 의뢰가 아닌 개인 작업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놀라운 지점입니다. 작업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어려운 작업이 많았어요. 앞서 제가 작업하는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상장례(喪葬禮)’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의식 중 하나인 ‘초분(草墳)’ 찍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초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보통 장례를 치르면 예전에는 땅에 묻는 매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초분의 초는 풀 초(草)자를 써서 시신의 관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자갈을 먼저 쌓고 그 위에 관을 놓아 볏짚으로 만든 용구세를 덮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한 삼 년 뒤에 시신의 살이 싹 빠져나가면 그 뼈만 추려서 땅속에 매장하는 형식이죠. 도서 지방에 주로 있던 관습인데 전남 청산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바다가 인접한 이 지역의 특성상 죽음의 순서가 자연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자식이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매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저변에 ‘효(孝)’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런데 이 초분이 제가 전남 청산도에 많다고 지금은 쉽게 말씀드렸지만 30년 전만 해도 어디 있는지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진도를 그렇게나 다녔어도 하나 보기도 어려웠죠. 그러다가 완도 촬영 중 현지인 에게 정보를 듣고 청산도로 들어갔는데 밭에 널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쌍 초분까지 발견되었는데 앞에는 아버지 초분, 뒤에는 아들 초분 이렇게 있는 형식이에요. 드디어 초분을 발견했으니 그것만 찍으면 성공이지 않으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부터가 기록의 시작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초분을 하는 장면과 초분을 해체하는 장면까지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장례의 특성상 가족들끼리 조용히 의식을 진행하니 일반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끈기를 가지고 마을 지관을 통한 설득과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작업들 입니다. 그렇게 작업한 기록들이 현재는 많이 쌓여있어서, 이를 정리해 책을 내려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많은 책을 내봤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집이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작업은 단체나 기관 혹은 의미 있는 누군가의 후원이 없이는 세상이 빛을 보기 힘든 작업이에요. 혼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적절히 그 조건과 시기가 맞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다음세대를 위한 기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농경문화의 바탕에서 자라오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문화의 소중함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산업화로 변하는 사회성이 큰 맥락의 근본적 원인이지만 계층적 소통의 단절, 과거와 현대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문화를 공부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겠죠.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현대 민속’은 그런 측면에서 더 맹렬하게 기록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니, 기록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음세대를 위한 기록은 차근차근 쌓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시적 결과물보다 꾸준한 교육이 기록을 대하는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도 끝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